
▲ 한국 배터리 3사가 중국 경쟁사와 대결에서 승산을 거두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원계 배터리 수요가 틈새시장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고 LFP 배터리에서 경쟁력을 따라잡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CATL 배터리 기술 전시장 사진.
한국 배터리 3사가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고가의 삼원계(NCM) 배터리 기술에 ‘올인’한 결과가 결국 중국과 대결에 치명적 약점으로 남게 됐다는 것이다.
1일 레스트오브월드는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은 50%, 중국 기업들은 90% 수준”이라며 “중국 배터리가 한국의 기술을 추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스트오브월드는 구글 창업자 에릭 슈미트의 딸 소피 슈미트가 설립한 비영리 매체다. 주로 미국과 유럽 이외 지역의 정보기술(IT) 관련 뉴스를 다룬다.
한국 배터리 3사의 공장 가동률이 CATL이나 BYD 등 중국 경쟁사의 절반 수준에 그치게 된 원인으로는 중국 기업들의 전략 변화가 지목됐다.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에 이어 2021년부터 한국 업체들의 주력 상품인 삼원계 배터리 생산을 대폭 늘리기 시작했다.
이는 삼원계 배터리 주요 원재료인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소재 가격을 끌어올려 LFP 배터리의 원가 경쟁력이 더욱 돋보이는 결과를 이끌었다.
조사기관 로디엄그룹은 “현재 삼원계 배터리 소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한국 제조사들은 여전히 생산 비용이 상승했던 시기의 여파를 겪고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중국 기업들은 결국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LFP 배터리를 앞세워 빠르게 고객사 기반을 확대해 나갔다.
결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대중화를 노리는 주력 차종에 LFP 배터리를 적용하고 한국 업체들의 삼원계 배터리는 고성능 및 고가 라인업에만 탑재하는 사례도 늘기 시작했다.
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 파워트레인은 레스트오브월드에 “삼원계 배터리 수요는 결국 틈새 시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결국 이에 의존하던 한국 업체들의 시장이 축소된 셈”이라고 전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LFP 배터리는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판단해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사이 중국 경쟁사들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장악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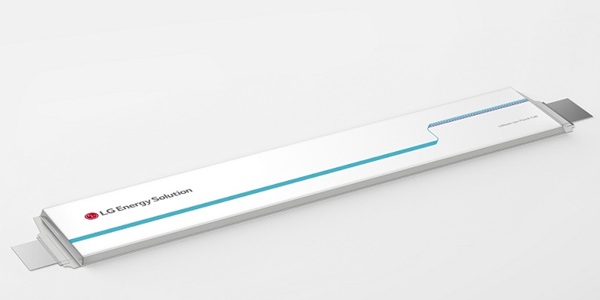
▲ LG에너지솔루션이 개발한 LFP 배터리 홍보용 이미지.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이미 압도적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확보해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울 만큼의 영향력을 갖춰냈다는 점도 한국에 불리한 요소로 지목됐다.
한국 업체들의 LFP 배터리 생산 규모는 중국 경쟁사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고객사와 협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술 측면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CATL은 배터리 셀을 1초 안에, 배터리팩을 약 2분30초 안에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는데 한국이 이를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CATL은 중국 내수시장에 그치지 않고 독일과 헝가리, 스페인 등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벌이며 한국 기업들의 ‘앞마당’으로 꼽히던 유럽 시장으로 진출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ATL 측은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해 온 결과”라고 레스트오브월드에 전했다.
컨설팅 업체 엑소피크는 한국 배터리 3사가 지난해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했음에도 미국과 유럽에 과도한 투자를 벌이며 전략적 패착을 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한국 업체의 공장 가동률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 중국 경쟁사들은 아시아 및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데이터는 결국 “한국 기업들이 갈수록 위축되는 프리미엄 배터리 시장에 계속 머무르거나 기존의 투자를 포기해야 하는 양자택일 기로에 놓여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레스트오브월드는 한국 업체의 배터리 수요가 급감하며 엘엔에프와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주요 소재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엑소피크는 “한국 업체들은 LFP 배터리 시장에서 생산 규모와 수율이 뒤처져 중국과 현실적으로 가격 경쟁을 벌이기 어렵다”며 “전고체 배터리나 소듐(나트륨)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에서 돌파구를 찾는 일이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진단했다.
다만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나트륨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며 시장 진출에 한국 경쟁사보다 앞서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국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가 확실한 돌파구를 마련할 새 계기를 찾지 못한다면 중국 배터리 업체들과 경쟁에서 승산을 보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김용원 기자









![[6일 오!정말] 국힘 권영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2/20260206163923_176657.png)

